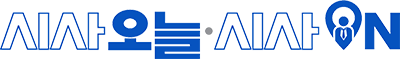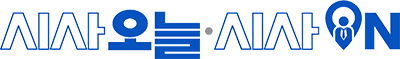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언론의 위기다. 수없이 듣던 얘기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만큼이나 전통이 있는 메시지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 것도 같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정 언론사만 위협하지 않는다.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언론의 힘은 독점에서 왔다. 취재원을 만나 정보를 얻고, 보기 좋은 글 또는 영상으로 가공하고,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독점하는 게 언론 권력의 핵심이었다. 이는 생산물을 ‘파는’ 능력을 상실한 언론이 여전히 하나의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 탓이다. SNS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했다. 과거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소유해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젠 휴대전화 한 대로도 가능해졌다.
독점이 무너지면 경쟁에 노출된다. 언론 종사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더 이상 SNS는 언론의 보완재가 아니다. 대체재다. 레거시미디어에 대한 소비는 점점 하락하고, 그 자리를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가 채우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정보의 질, 전달 속도, 재미, 신뢰성 등의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는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끌어당길 ‘뭔가’가 필요하다.
문제는 기성 언론이 ‘SNS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언론이 전문가의 ‘멘트’를 따와서 전달하는 동안, 유튜브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사안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언론이 정보를 ‘틀’에 맞춰 가공하는 동안, SNS에서는 이미 자유롭게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기자들이 SNS에서 얻은 소스를 가공해 뉴스로 내보내는 세상이다. 콘텐츠의 재미야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기성 언론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공공성’과 ‘신뢰성’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언론은 공공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이다.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뉴스는 무료’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언론의 수익은 거의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한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콘텐츠 판매 수익이 광고 수익 비중을 넘어선 언론사는 뉴욕타임즈 정도다.
뉴스를 사는 사람이 ‘국민’이 아닌 ‘정부’나 ‘정당’, ‘기업’이라면,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성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불특정 다수 시청자, ‘대중’이 소비자인 유튜버가 공공성과 신뢰성 담보하는 데 더 유리한 측면마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진부한 결론이지만, ‘변화’밖에 없다. 수익구조부터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 형태, 목적 등 모든 걸 바꾸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무리 ‘SNS는 언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외쳐 봐야, 이미 SNS는 기성 언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기성 언론의 필요성을 웅변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
제22대 총선을 통해 더 이상 기성 언론의 영향력이 과거 같지 않음이 증명됐다. 독점 구조가 해체된 뒤 벌어진 SNS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현실이 명징하게 드러났다. ‘SNS는 신뢰할 수 없다’는 기성 언론의 외침조차 SNS에서 소비되고,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다. 이제는 케케묵은 계몽주의를 버리고, 언론 종사가 모두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아닐까.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