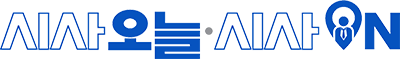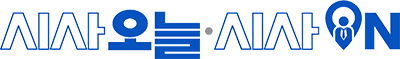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순자 자유기고가]
“여-보-세유-나 구 여사 여유…”
들려오는 목소리가 틀림없는 구 여사의 목소리였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갑게 나갔다.
“오늘 저녁 유- 소장님이 회식을 한 대-유-”
주석 씨의 말에 의하면 내일 밤에 나를 만나준다고 한 소장이 왜 갑자기 회식을 쏜다는 걸까?
일이 어그러져 가는 불길한 기분이 엄습했다.
“오후 5시 30분까지 백화점 앞으로 다-모이래-유. 낮 조 들도 다 같이 모인 대유. 꼭 오셔-유….”
“나 오늘 바빠요. 못 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맛있게들 잡수세요.”
그리고 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가뜩이나 기분이 더러운데 구 여사의 전화를 받고 나니 기분이 더욱 더러워졌다. 시간이 오후 4시인데도 나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다.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아들을 위해 늘 새로 끓여 놓는 찌개나 국도 끓이지 않고, 정말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싶기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혹시, 내 자식들은 사회에 나가 제대로 적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자식들이 불쌍해졌다.
순간,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좀 큰 가방을 챙겨놓았다.
나는 아무래도 백화점 미화 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나의 반찬 통들을 가져와야 할 것 같다.
멍-하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심하게 시장기가 느껴졌다. 밥을 차려서 마-악 먹으려는데 핸드폰이 또 울린다.
받아보니, 재순의 목소리였다.
“언니, 오늘 회식에 갈 거야?”
“나, 오늘 바빠서 못가…”
지극히 사무적으로 나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문방구에 들려서 복사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는 멍-하니 방바닥에 누워 천장과 벽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은 엄청 지루하다.(계속)
※ 시민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10년 백화점 청소일 당시의 체험소설이며 글을 쓰는 이순자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78세 할머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