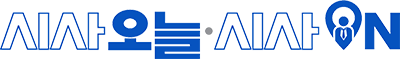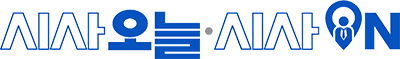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순자 자유기고가]
재순의 말대로 백화점 다음의 정류장에서 내렸다.
딱 재순이 방긋 웃으며 서 있다. 이미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핸드폰으로 통화했기 때문에 정류장에 서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재순이 내 손을 잡고 작은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재순은 커피를, 나는 우유를 마셨다.
재순이 말을 꺼냈다. “언니, 어젯밤 내가 한말 어떻게 생각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재순에게 심한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도 없으니 적당선을 찾아 말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나는 재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재순 씨, 내가 어젯밤 재순 씨 메모를 보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볼 땐 순옥의 잘못보다도 감독의 잘못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야, 감독은 순옥의 그런 것을 즐기고 있었어. 그리고 전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어. 내가 볼 땐 감독은 해고 감이야, 재순 씨는 어떻게 생각해?”
재순은 내 말을 곱씹고 있었다. ‘배알이 꼴리겠지.’ 나는 속으로 은근히 재순을 욕하고 있었다. 재순이 결심이라도 한 듯 “언니 그럼 내가 순옥이 집 찾아 가는 건 반대야?” 라고 물었다.
“맞아. 재순 씨, 생각 해봐, 만약에 순옥이 쪽에서 재순 씨를 고소라도 한다면 어떡할 거야?” 내가 자못 진지하게 말하자 재순이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언니 그게 고소거리가 돼?” 라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재순 씨, 내가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결국 법이라는 것도 상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 만약에 그쪽에서 억울하다고 고소라도 한다면 재순 씨는 반박을 해야 하는데, 누가 재순 씨 편에 서서 증인을 서 줄 거며…. 안 그렇겠어?"
나는 재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듣고 보니 언니 말도 일리가 있네,” 재순의 말이 떨리는 듯 힘없게 들렸다. 또한, 그 말에는 체념의 뜻도 담겨 있는 듯했다.
“사실은 언니, 내가 앞으로 약 한 달 정도만 더 다니면 퇴직금을 탈 수가 있거든, 그런데 어디 속이 뒤집혀서 다니겠어?, 언니도 봤지. 어젯밤에 감독이 하는 거 말이야. 세상에, 내가 열 달도 넘게 기계를 돌렸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순옥이한테 시키는 것 좀 봐…. 언니 진짜 나 어젯밤에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도 몰라, 야, 감독이 순옥이한테 완전히 미쳤나 봐.”
“재순 씨, 감독은 원래 미친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겠어? 작업장에서 음주 행위하고 구 여사한테 커피 심부름에 나이 많은 직원들한테 찍찍 내뱉는 반말하며 출근부에 개개인 사인을 하는데 왜 또 전화기에 대고 출퇴근 보고는 받는 거며, 순옥이 따라 주는 술과 안주는 왜 받아먹느냐는 거지.”
“언니, 그럼 언니가 감독한테 뭐라고 할 거야?”
재순이 잠시 눈을 내게로 고정시키듯 했다.
“재순 씨, 이 상황에서 직원들이 감독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절대로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 거야.”
“언니, 그랬다가는 언니만 쫓겨나면 쫓겨났지, 감독은 꿈쩍도 않을 걸~.”
재순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피차 파악한 상태였다. 나는 썰렁해진 틈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었다. “재순 씨, 기왕이면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재순의 의중을 빤히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말하며 이 어색한 자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재순이 핸드폰을 보더니 “언니 시간 다 됐다” 라면서 내 손을 잡고는 자리를 박찼다. 지하 6층 미화 방까지 오는 동안 재순과 나는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 시민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10년 백화점 청소일 당시의 체험소설이며 글을 쓰는 이순자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78세 할머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