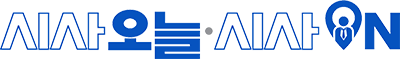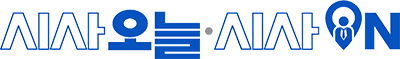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힘드십니까? 행동하면 바뀝니다.”
설 당일인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지면 불만족스러운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 관습’입니다. 야당을 찍으면 정부를 심판할 수 있고,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대표의 말에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뭐가 바뀐다는 거지?’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위성정당 포함)은 무려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엄청난 의석수였죠. 그러나 불과 2년 후,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됐죠.
그로부터 2년 동안 펼쳐진 모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해 국회에서 단독으로 9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가의 보도’인 거부권 행사로 대응했습니다. 당연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상대를 악(惡)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문화에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야당의 정치공학적 노림수, 정부·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결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초거대 여당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완승을 거둔다고 해도, 정치적 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회는 민주당이,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모양새겠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가 맞서는 그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그리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를 ‘악마’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여야가 타협적 모습을 보이는 건 각자의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기 딱 좋은 행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양보와 타협’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이낙연 전 대표가 ‘협치’를 말했다가 낙마했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굴복을 바라는 것일 테고,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은 민주당 요구를 거부할 겁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업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 붙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지난 2년이 앞으로 3년 더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업고 윤 대통령을 굴복시키려 하면 앞으로의 3년은 지난 2년의 재판(再版)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양당의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어떤 묘수를 통해 상황을 바꾸겠다는 걸까요. 이미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또 한 번 표를 던지면 ‘바뀔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약속보다는, 이 대표가 그리고 있는 구체적 청사진이 듣고 싶습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