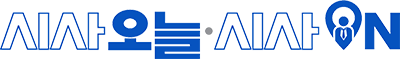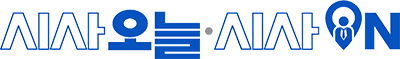홀로 살되 결코 홀로 살지 않는 숲의 생명, 인간 사회에 적용할 필요 있어
“인간이 숲의 방식 채택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성장’을 이뤄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숲은 생명이 자라나는 요람과도 같아 사람의 삶에서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받는 것 없이 무한히 베풀고 아낌없이 주는 숲. 이에 숲을 중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동반성장’을 꾀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동반성장연구소 주최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제103회 동반성장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동반성장포럼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기존 강연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평소와 같이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동반 성장이 아닌, ‘숲’을 주제로 내세운 것이다.
이번 동반성장포럼의 강연 주제는 ‘숲에게 길을 묻다’로, 김용규 여우숲 생명학교 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김 교장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넘치는 지식과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주제 발표에 앞서 운을 뗐다.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남과 비교하며,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어느 하루는 길을 지나다 올려다본 정신과에 ‘소아정신과’라고 써져 있는 것을 봤다. 아이들이 정신과를 다녀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되물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뿌리깊게 병들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김 교장은 자신 역시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다. 좋은 연봉과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그러나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숲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김 교장. 그는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 방법을 숲이라는 스승이 알려줄 수 있다며 주제 발표의 서막을 열었다.
숲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이유로 그는 △저절로 푸르러진다 △저절로 다양해진다 △저절로 그윽하고 향기로워진다, 이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원리를 우리 사회가 각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숲과 같이 사람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숲의 생태와 그 안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들을 소개했다.
스크린 가득 식물의 사진이 떴다. 김 교장의 집 앞 마당에 자란 ‘질경이’다. 질경이는 풀밭이나 길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다. 김 교장은 “햇볕을 많이 받는 특성 탓에 그늘이 덜 지는 곳, 양지에서 자라는데 이 때문에 길가에서 자주 자라게 돼 사람들의 발에 채이고 밟히는 생을 산다”고 말했다.
이어 “길가에 자란 식물들이 어떻게 되겠나? 많이 밟히게 된다. 질경이는 밟히는 것이 생의 숙제고, 그를 극복해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숙명을 지닌다. 이렇게 욕망이 부딪히고 조화를 이뤄내면서 하나의 숲이 조성된다”고 했다.
김 교장은 숲이 생기는 원리를 인간 사회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창했다. 그러면서 왜 인간은 향기롭고 그윽할 수 없는지에 대해 되물었다. 다음은 그가 인용한 정희성 시인의 시 ‘숲’ 중 한 구절이다.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인데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 김 교장은 숲에 사는 생명들은 홀로 살되 결코 홀로 살지 않는다고 답하며 ’수관기피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숲에서 하늘 높이 자란 나무들을 바라보면 일정하게 길이 나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빽빽하게 자란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가 맞닿지 않도록 마치 일부러 ‘양보’라도 한 모양새다.
이는 각 나무들의 윗 부분이 서로 닿지 않고 일정 공간을 남겨둬, 나무 아래까지 충분히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끔 돕는다. 다만 이 현상이 정말 나무들이 서로를 배려해 ‘양보’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가설들이 있으나 김 교장은 나무들이 양보하는 공간이 만들어짐에 따라 공생을 위한 토대가 세워진다고 부연했다.
김 교장은 “이와 같이 서로 양보하고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윗 세대들이 조성해야만 비로소 인간 역시 향기나고 그윽한 숲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숲의 방식을 채택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Do or do not There is no 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