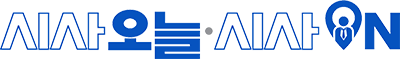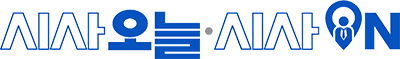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한다. 하물며 성(姓) 다른 형제야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모았던 두 ‘형제’의 운명도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했다. 7월 초까진 그랬다.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공언했다. 혁신위원회를 띄워 공천개혁을 천명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입장에서 이는 이 전 대표가 차기 ‘공천’을 관장하려 한다고 판단했을 듯싶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득권은 곧 공천권이다. 공천권자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인다. 이 전 대표의 공천개혁은 ‘윤핵관’에게서 기득권을 빼앗겠다는 선언이었다.
당연히 윤핵관이 힘을 합쳤다. 이 전 대표가 밀려난 배경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윤핵관도 분화(分化)됐다. 7월 29일. 이른바 ‘신(新) 윤핵관’들은 “신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다”며 연판장을 돌렸다. 신 윤핵관들은 장제원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에 부정적이었다. 비대위 전환은 사실상 권 원내대표와 장 의원 사이의 권력다툼이었다. 이후 정치권에선 차기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을 앞세운 신 윤핵관과 권 원내대표의 ‘정면 대결’이 펼쳐질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라는 변수가 더해졌다. 비대위 구성으로 직(職)을 잃은 그는 법원으로 향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권력 투쟁의 장’이 됐다.
역사적으로 권력은 늘 내부 투쟁으로 귀결됐다. 현 국민의힘 상황이 이례적이진 않다. 문제는 시점이다. 코로나19가 유발한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환율이 급등하고 유가도 치솟았다. 무역적자도 심화됐다. 물가상승은 모두가 체감하는 수준이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적 지표도 개선의 기미가 없다. 여기에 기후위기마저 눈앞에 닥쳤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권력 투쟁으로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 여론이 좋을 리 없다.
영국의 역사가인 허버트 피셔(Hubert Fisher)는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라 했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을 앞세워야 하는 게 정치인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엔 정치의 본지(本旨)가 보이지 않는다.
권력 싸움도 정치의 일부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세상만사엔 우선순위가 있다. 부디 잠시 권력 다툼은 뒤로 미뤄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도, 국민의힘에도 미래가 없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