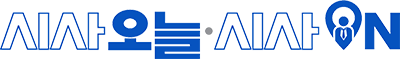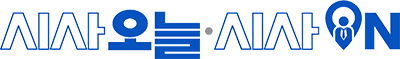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순자 자유기고가]
아주 허름한 집이다. 지붕은 슬레이트였고, 담은 벽돌과 시멘트다. 방이래야 일자로 하나 둘 셋이었다. 방 두 개는 붙어있었고 방 하나는 별도였고, 불 때는 아궁이가 따로 있었다.
본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엌과 문이 통해있는 방과 그 옆방은 기름보일러가 놓여있었다.
우리집 식구는 모두 6명이다.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두 내외와 아이들 셋이었다. 안방을 친정아버지가 쓰셨고 불 때는 방을 두 내외가 썼다.
화장실은 마당 한옆에 붙은 재래식이다. 이사 가는 첫날부터 아이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다. 어찌 아니겠나. 이제 겨우 사춘기가 지날 무렵의 고등학생이 둘이나 있었다. 하루하루 아이들의 짜증을 달래가며 살고 있는데, 하루는 큰딸이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왔다.
어찌된 것인가를 물으니 울타리 밑에서 울고 있는 것을 안아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들고양이 새끼인 것 같은데 어미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집에서 보호하고 어미가 찾아오면 내어주기로 했다. 고양이는 방에서 길러야 했고 먹을 것을 조심스레 주니 조금씩 받아먹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고양이는 아무 탈 없이 커갔다. 이름을 아롱이라 지었다. 왜냐하면 노란줄기와 흰색이 아롱아롱 섞여있기 때문이었다.
아롱이가 어느 정도 커지자 읍내로 매일 출근하는 남편은 날마다 동태를 한 마리씩 사왔고 나는 그 동태를 삶아서 아롱이에게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랐다.
한 6개월 지나자 아롱이는 어른만큼 자랐다. 그때부터 출타하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아롱이는 수놈이었던 것이다. 암놈 생각이 나서 출타하는 모양이었다. 어느 때는 울타리 너머에서 수놈끼리 으르렁 대며 싸우는 소리도 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이름은 설공주라는 곳이다. 집이라고 해야 겨우 7채 정도 되는 산 밑의 남향판으로 아늑하고 아주 조용한 동네였다. 낮에도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웠고 모두 농사를 짓는 집들이었다.
그래도 면소재지여서 조금 걸어서 올라가면 집이 약 100여 채 되는 큰 동네가 있었다. 두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시내버스도 있었다. 면사무소도 있었고 파출소도 있었고 초등학교도 있는 갖출 건 다 갖춘 지역이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설공주’라는 이름으로 좀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알고보니 청주 곽씨네 집성촌이었다. 세월은 흘러 둘째딸이 먼 곳으로 대학을 들어갔고 아들은 타지의 실업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큰딸은 집에서 외할아버지를 보살폈다. 어미인 내가 일을 다니니 낮에 거동이 불편하신 친정아버지를 보살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아롱이가 온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그사이 더욱 큰 고양이가 되었다. 하루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쏘다녔다. 먹는 것과 자는 것만 집에 와서 했다.
하루는 이상하게도 집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주변을 찾으며 “아롱아” 하고 소리쳐 불러봐도 돌아오지 않았다. 온 집안 식구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때가 되어서 아롱이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안고 보니 앞다리 하나가 절단이 되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아마도 산짐승 잡는 덫에 치인 것 같았다. 먹을 것을 주니 허겁지겁 먹었다. 이튿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 치료도 하고 약도 사왔다.
아롱이는 거의 한달 간 집에서 요양을 했다. 그러나 기운을 보충하면서는 다시 야성이 살아나서 자꾸 밖으로 돌려했다. 아무리 못나가게 해도 그 야성을 잠재울 수 없었다.
풀어주니 아롱이는 절뚝대는 채로 다시 밖으로 나돌았다. 어느 때는 밤중 울 너머에서 아롱이의 아우성이 들리기도 했다. 그러면 우리 내외는 잠결에도 기겁을 하며 달려 나갔다. 아롱이는 무시무시한 상대에게 두드려 맞고 있었다. 앞발이 하나밖에 없으니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게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타일러도 말 못하는 짐승이니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집안 식구들은 아롱이가 집에 없을 때는 또 어느 힘 센 놈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었다. 아무 일없이 밖에 나가 놀다가 집에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다. 여름이 가고 또 낙엽 지는 가을이 왔다. 장때가 되어서 다 해놓고 아롱이 담요도 새로 사온 것으로 깔아놓았다. 그리고는 놀러 나간 아롱이를 기다렸다.
날이 깜깜해져도 아롱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와 남편은 주위로 나가 “아롱아” “아롱아” 큰소리로 한참을 불렀다. 그러나 아롱이는 그날 밤도 이튿날 밤도 계속 돌아오지 않았다. 윗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롱이를 못 보았느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롱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1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아롱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집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다. 만약 아롱이가 이때까지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서울 구경을 했을 것이다.
살면서 추억도 많고 슬프고 안 좋은 기억도 많다. 아롱이도 그 중 한 기억이다.
제일 귀여운 기억은 따뜻한 봄날 식구들이 외출할 때면 마당에서 이리저리 몸을 굴리며 애교를 떨 때다. 아롱이가 주인에게 베푸는 보답의 인사였다. 그러면 주인들은 아롱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아롱이는 무슨 사연으로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아마도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말로는 통할 수 없어도 눈빛과 행동으로 통하는 사람과 고양이의 대화도 보통 인연은 아니다.
겨울날 추워서 이불을 덮고 누우면 슬며시 다가와서 몸을 비비대며 안겨드는 그 포근함도 잊을 수가 없다.
설공주는 참으로 조용한 동네였다. 온종일 가도 사람 구경 한번하기 어려운 동네. 그곳이 그립다. 아롱이도 그립다.
※ 시민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순자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78세 할머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