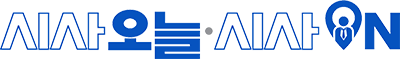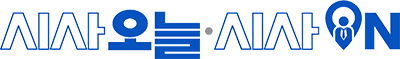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민'이라는 말을 쓰는 걸 가급적 지양하는 편이다. 상대적인 표현이어서다. 서민의 사전적 뜻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특권이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경제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만 사용 가능한 셈이다. 그게 참 싫었다. 냉혹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픈 '서민'의 개똥 같은 규칙인 거다. 하지만 가끔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있다.
요즘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 일대에는 '못 받은 돈 있으면 신고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고도 재하도급(불법이다)업체 또는 노동자들에게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늘자, 원청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측에서 내걸은 거라고 전해진다. 또 얼마 전 온라인상에선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시공을 맡은 국내 현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노동자가 '월급을 한 달 반 동안 못 받아서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슈화되기도 했다. 하청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돈을 임의로 굴리다가 늦게 지급하는 건 건설업계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근래 자주 목격되는 걸 보면,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 돈맥경화'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 지시사항' 자료를 내고 채권시장안정화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이른바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금융위 측은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부동산 PF와 관련해 필요 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PF는 시행사·시공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개발 부지를 사들인 후 아파트 등을 지어서 수익을 낸 다음 금융사에 원금과 이자 등을 갚는 구조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전(前)정권 하에서의 집값 폭등 흐름을 타고 급격히 확대됐다. 그리고 올해 들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침체되자, 고스란히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금융사들이 대출을 내 주길 꺼리면서 건설사들의 재무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약 2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최대주주인 롯데케미칼로부터 5000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운영자금 확보라는 게 롯데건설의 설명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발표한 '건설업 신용보강 A to Z' 보고서에서 "브릿지론에 들어간 신용공여 등 때문에 롯데건설의 미착공사업 비중이 70% 이상이다. PF 우발채무 규모와 질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롯데건설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우건설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00억 원 규모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눈길을 끌었다. P-CBO는 저신용등급 업체들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용도를 채운 후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산다. 롯데건설의 사례처럼 그룹사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땐 대우건설처럼 평판 훼손을 무릅쓰고도 시중 조달 금리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채권시장안정화펀드 재원 투입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세금을 들여 망한 대기업을 살리는 일도 다반사다. 부동산과 토목으로 고속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대형 건설사라는 타이틀은 일종의 벼슬이자, 특권이다. 오너일가와 머슴으로 구성된 임원들도 대강 사는 듯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롯데건설의 등기이사·감사 1인당 평균보수액은 전년 동기보다 23.72% 늘었다. 같은 여의도 지라시에 언급된 태영건설의 그것도 동기간 4.38% 올랐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들, 그 아래에서 일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 경영상 이유라는 합법적 명분으로 짤리고, 후려치기와 계약 해지를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쫓겨난다. 건설업계의 서민이다. 이들은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생존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21일 현장 노동자 5명이 추락해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중상(이날 18시 기준)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경기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SGC이테크건설, 해당 업체는 올해 상반기 119억564만 원의 대손상각비 인식, 미청구공사 증가 등으로 연결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적자전환했다. 충남 지역의 중견 건설사인 우석건설은 납부 기한이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달 말 1차 부도 처리됐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역량이 떨어지는 지방 업체들부터 나가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형 건설사 살리기에 나섰고, 위기를 극복한 대기업들은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건설업계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었다. 과연 옳은 일일까. 고통이 불가피하다면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금융 지원 등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산업구조·고용구조상 건설업 종사자들의 비극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 전방위로 파급된다.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되는 대마불사-소마필사의 역사,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