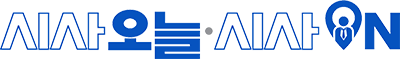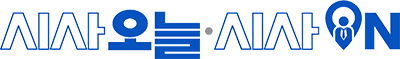줄세우기와 극한 대결정치로 한계 직면
수명다한 선거구제 개편, 여야 나서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대한민국 표심을 지배하는 형식은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킨 측면이 강하다. 제21대 총선과 제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까지 영호남 대립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양당 체제도 심화된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소선거구제에선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로 표심이 쏠린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거대 양당 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1948년 제헌국회 ‘소선거구제’…1973년 유신체제서 ‘중선거구제’ 도입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 실시…지역주의 심화돼
‘국민의정부’부터 계속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 …尹 정부서 이뤄질까
현행 소선거구제 배경엔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녹아있다.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유신 체제 이후인 1973년 9대 총선부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된다. 박정희 정권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선거구마다 두 명씩 뽑으면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우세한 여당 후보가 한 명씩은 당선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만들어진 중선거구제가 소선구제로 다시 바뀌기 까지 여러 정치적 사건을 거치게 된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통해 그해 10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진다. 두달 뒤인 12월 치러진 13대 대선에선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을 잇는 여당의 노태우(대구·경북)와 이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나선 야당의 김영삼(부산·경남)·김대중(호남)·김종필(충청) 등이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결과적으로 네 후보가 각각 36.6%, 28%, 27%, 8%를 득표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정권 창출에 실패한 YS-DJ는 4개월 뒤 치러질 13대 총선을 위해 야권 통합을 논의한다.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DJ는 ‘소선거구제 합의 후 통합’을 요구했다. 이에 YS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권 통합을 조건으로 소선거구제 요구 수용’ 입장을 밝혔다. YS의 양보로 ‘소선거구제’는 도입됐다. 하지만 야권 통합은 무산됐다. 그해 총선에선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 지역주의 구도가 깊이 뿌리내렸다.
이후 정치권에선 지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1999년 출범한 국민의정부에선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나왔다. 참여정부에서도 2003년·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MB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됐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가진 만찬에서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 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정치 개혁 공약’과 관련해 “국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정치를 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주의’가 ‘거대 양당 체제’ 낳아
“국회의원에 ‘지역구 민원 해결사’ 강요 분위기 조성돼”
당 안팎 극한 대결 정치·공천 줄세우기 등 악순환

전문가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거대 양당 체제 강화’를 한목소리로 꼽았다.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승자 독식 주의를 낳고 이는 지역구도 심화, 거대 양당 체제 공고화, 극한 대결 정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소선거구제 폐단으로 ‘거대 양당 구조’와 ‘지역구도 심화’를 짚었다. 이 위원은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 정서가 강화된다. 아무리 일을 못해도 그 지역 기반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출될 수 있다. 호남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영남에는 민주당 소속이 당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18일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미래 의제를 논하기보다 ‘지역구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도록 강요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으로선 이러한 지역 분열로 얻는 기능적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에서 공천만 받으면 높은 확률로 당선된다.
실제로 지난 8회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7회 지선에 비해 5배 늘었다. 이는 지역주의가 확고한 영호남을 비롯해 충청권에서 발생했다.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군·해남군,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 등에선 기초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되는 일도 있었다.
후보 개인의 역량보다 소속 정당이 지역에서 갖는 영향력이 당락을 좌우한다면,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후보자에게 ‘정당에서 공천받기’가 우선 과제가 되면 당협위원장의 줄세우기 정치, 불공정 공천 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만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 1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의 정치문화는 올오어낫싱(all-or-nothing) 게임”이라며 “대통령도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매일 비판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공천에만 매달려, 정책 대안은 없고 상대 당, 상대 후보가 잘못돼야 내가 이득을 본다는 생각만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정세운 시사평론가는 21일 통화에서 “1987년에는 독재 정권 청산을 위해 소선거구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만 지속되고 있다. 거대 양당은 매일 싸우고 법정 다툼을 벌인다. 제3정당은 출현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며 “현 선거제도 하에선 승자 독식주의가 이어질 뿐이고 지역에 기반한 공천,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 등 문제가 발생한다. 화합-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선거구제 개편은 당위다. 이제 진정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때”라고 진단했다.
양당 체제로 제3지대 설 자리 사라져…득표수·의석수 괴리로 타격
양재진 “온건다당제로 의회 입성 문턱 높이고 비례대표제 실시해야”

양당 체제가 공고해지면, 소수당이 설자리가 사라진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다. 정치의 발전을 위해선 양대 정당인 민주당·국민의힘의 독주를 견제하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는 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유권자들이 제3세력에게 표를 주기 어렵다. 평소에는 제3정당을 지지하다가도 막상 선거 때만 되면 사표 심리 때문에 거대 양당 후보들을 찍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에 괴리를 초래하기도 한다.
19대~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차지한 의석 비율은 각각 93%, 81.7%, 94.3%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정당득표율 2위를 기록하고, 호남 지역구 23석을 포함해 38석 확보하는 등 약진이 있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도로 양당체제로 돌아갔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창당, 사실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했다.
이와 관련,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선거 제도 개편은 필요하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히, 다당제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성’과 관련해선 “다당제도 그냥 다당제가 아닌 온건다당제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5% 이상 득표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의회 입성 문턱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해야 한다”며 ‘온건다당제’ 도입을 강조했다.
소선거구제 대안으로 꼽히는 ‘중대선거구제’…사표 방지·소수자 대변
정치양극화·팬덤현상 극복…여성 참여 확대부터 가치정당 출현 가능성도
소선거구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되고 있다. 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2인에서 5인을 선출하는 제도는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사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소수자를 포함해 다양한 유권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도 등장할 수 있다.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26명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한국 정치를 그동안 주도해온 양대 정당은 그 개선은커녕 서로 퇴행적 악순환을 촉발하고 방조했다”며 “민주당 개혁은 당 차원에서의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전 정치권에 대한 처방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다양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언했다. 박재호 의원도 1일 인터뷰에서 제도 개편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양극화 현상과 팬덤 현상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의 현실성에 대해선 “이해관계 구성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운 시사평론가는 “소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이점도 있지만 현재는 극한 정치 대결로 치달아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 중선거구제가 양당의 지리멸렬한 싸움을 해소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고, 보다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내건 제3정당 출현 가능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지역주의 완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군소정당들 형편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지역구도가 타파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에서 당선 확률이 높은데, 여러 후보자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주의가 강화될 위험성도 있다. 다만 여성들의 정치 참여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가 지적한 '복수 공천' 문제는 선거법 개편 논의가 현실화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 ‘권력 구조’에 근본적 문제…거대 양당, 제도 개편 주체로 나서야
양당 체제 고착화와 지역 구도 심화는 ‘선거 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마다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거대 양당이 위험부담을 감수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폐지되거나 중선거구제가 채택돼 생기는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현 기득권 세력이다. ‘공천’에 정치적 생명력이 달린 거대 양당 소속 의원들로선 당장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기 어렵다.
전예현 객원교수는 “거대 양당 구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정치 체제를 바꿀 의지가 과연 거대 양당에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 정치개혁을 주장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됐다. 특히 올해 3월 대선-6월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에 양당이 머뭇거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 의원의 경우, 대선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이후 이 논의는 사라졌다.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도 19일 통화에서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주도해 선거구를 개편하긴 어렵다고 본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양쪽이 목숨을 걸고 승리를 위해 다투는 와중에 실제적으로 ‘룰’을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다당제를 위해선 단순히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아닌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신율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으로 거대 양당 체제 문제점이 계속 꼽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내각제로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당제 등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