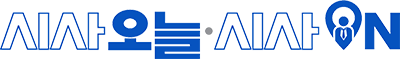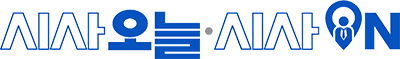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선거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 이겨야만 살 수 있는 치킨게임이다. 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죽고 사는 데 걸린 문제이다보니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선다. 생존본능이 지배한다. 온갖 인간 군상이 날뛰는 아수라가 선거판이다.
“이곳에는 들뜬 군중이 있고 시기심으로 꽉 차 있는 반대파가 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 행적은 물론이고 정치적 신조나 때로는 개인적인 성격까지 물고 늘어지기 일쑤다. 야유와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악의에 찬 창백한 얼굴의 청년들과 짧은 머리에 불독상을 한 젊은 여성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기기묘묘한 추접한 질문들을 마구 퍼부어낸다.”
20세기 위대한 정치가 처칠이 내린 선거에 대한 진단이다. 처칠은 선거의 달인이다. 평생 15차례의 하원선거를 치렀으니 정치인생의 대부분을 선거로 보냈다.
처칠은 한 번 선거를 치르는 데 최소 3주가 소요되는데, 사전 1주일은 선거 멀미에 시달리고, 선거 후 1주일은 선거라는 홍역으로부터 서서히 회복해 가면서 밀린 외상값을 갚는 것이 보통이라고 회고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후보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3주가 아닐 수 없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15회의 선거 중 10번을 이기고, 5회는 졌다. 특히 전쟁 직후 치룬 총선에서 패배했다. 영국 국민은 전쟁 영웅 처칠에게는 환호했지만 전후복구를 위한 지도자로선 인정하지 않았다. 냉혹한 민심이다. 하지만 처칠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 오지 않았다. 그 후 6년 이상 평의원으로 의회를 지켰다, 77세가 되던 1951년 다시 총리에 선출돼 81세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민이 자신을 필요할 때가 오리라고 믿었던 덕분이다.
처칠 2기 내각은 달랐다. 1기 내각이 제2차 세계대전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2기는 앞선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 내각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는 포용성이 돋보였다. 오히려 자당의 강경 우파를 견제하며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 지지층을 넓혀갔다.
특히 선거 승리의 과도한 축배보다는 근소한 득표율 차이에 주목하는 노련함이 빛났다. 처칠은 노동자 지지층을 위해 복지정책기조를 유지했고, 주택공급에 주력했고 규제 완화와 소득세 인하 등 보수당의 색채를 지웠다.
처칠의 위대한 업적은 한국전쟁을 제3차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 않게 한 중재력이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적극 지원했지만 중국과 소련과의 막후협상에서 지대한 역할을 맡아 휴전을 이끌어냈다.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서도 처칠은 빛났다.
대선이 20일도 채 안 남았다. 이번 대선이 워낙 막장이라는 세간의 평을 받고 있지만 막판으로 치닫자 고소고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각종 마타도어는 기본이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기엔 국격이 현저히 떨어진다.
눈앞에 선거 승리만 보이는 이들에게 이성을 되찾으라고 하기엔 시간이 늦은 듯하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다. 이성적이지 않은 선거판의 속성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이성을 잊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이를 실천했다.
나치 침략에 맞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승전 후 국민의 외면을 받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의회를 지키며 2기 내각을 창출해 복지와 노동개혁을 주도하며 대영제국의 부활을 이끌었다. 처칠은 감정이 아닌 이성을 잃지 않은 품격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국민보다 내’가 앞선 정치 후진국 한국의 정치꾼들이 처칠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