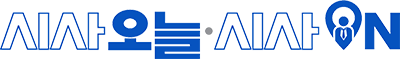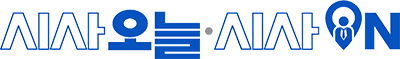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발점(始發點)은 상임위원장 선출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비박(非朴) 황영철 의원과 친박(親朴) 김재원 의원이 맞부딪쳤기 때문입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예결위원장 자리는 안상수 의원과 황 의원이 1년씩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황 의원 차례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김 의원이 ‘당시 기소로 당원권 정지 중이어서 합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경선을 요구한 겁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친박 의원이자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선을 하면 황 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황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고, 김 의원은 무난히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러자 황 의원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측근을 예결위원장에 앉히기 위해서 당이 줄곧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과 민주적 가치들을 훼손했다”며 지도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연히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더 넓게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대체 뭐기에 같은 당 의원들끼리 감정싸움을 불사하는 것일까요.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일까요.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국회의 모습은 본회의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싸우기도 하고, 표결도 하는 공간 말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일터’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란 어떤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하는 곳인데요. 농업과 관련된 안건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환경문제에 대한 안건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식입니다.
이 같은 상임위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 상임위원장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고, 의안 회부 여부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안의 운명’이 상임위원장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특정 법안 통과나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면 상임위원장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히 상임위원장은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현실적으로 소관기관이 상임위원장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국토교통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은 ‘꽃 중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지역에 도로나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쉽고, 예산안 처리 과정을 주도하는 예결위원장은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어필하기에 이보다 좋은 자리는 없죠. 원구성 때마다 국토교통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