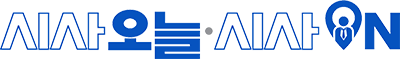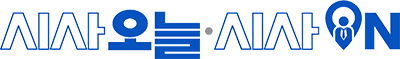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9년 서울 동부권역 소재 택지지구에 위치한 매머드급 단지 3곳에서 대규모 하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세대 내 천장 누수, 공용부 마감 부실,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따른 단열재 밀림 현상 등이 발견됐고, 이를 인지한 각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 보도를 요청한 것이다. 불안감을 호소한 입주예정자들은 3개 단지를 합쳐 약 9000세대에 달했다. 시행사·시공사가 아니라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해야 빠른 민원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현장소장의 연락처를 입수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원을 밝히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른 번호를 알려줬다. 누구냐고 물으니 해당 현장의 언론 담당자란다. 그 담당자에게 연락해 신원을 밝혔더니, 용건은 묻지 않고 대뜸 "잡지사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인터넷신문 겸 잡지사'라고 답하자 그는 "100권씩밖에 안 됩니다"라며 뚱딴지 같은 말을 했다.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무슨 얘기인지 깨달았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자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어 연락했다'고 설명한 후에야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책 사줄 돈으로 공사나 제대로 하지 싶었다. 결국엔 다 분양가에 반영되는 비용이 아닌가.
이듬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청약 시장 수요자들 사이에선 수도권 서부 지역에 약 5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역세권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았다. 시행사도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써 가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인근 마을이 정부로부터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단지 근처에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 즐비했고,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데다 일대 아파트 공급 물량이 입주 시점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안정적인 전매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역 주민과 부동산중개업자, 환경부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해 이 같은 점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한 분양 대행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전화였다. 사실과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고 대답하고 말았다. 그날 이후 몇몇 타 매체 후배 기자들로부터 푸념 섞인 문자를 받았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준비하려는데 취재 과정에서 막혔다는 내용이었다. 이래서 분양가가 높았나, 착잡했다. 그해 해당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공교롭게도 앞서 거론한 단지들 중 대부분이 2023년 들어 부실시공, 하자 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철근이 튀어나오고, 주차장과 공동현관이 침수됐다. 모두 준공·입주한 지 3년 안팎 아파트들이다. 돈이 줄줄 새다 보니 철근과 빗물도 줄줄 새는 걸까. 확신이 없었는데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 만난 한 공직자 출신 현장 전문가가 절반의 확신을 줬다. 그는 "사고 원인 파악 후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해먹고 빼먹고 남은 걸로 공사를 해도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계를 보강한다. 도둑들이 훔쳐가고도 남을 정도로 값이 비싼 공법을 필요 이상 설계에 반영하고, 자재도 3분의 1 이상 해먹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뤄진다. 그리곤 기술 발전이라고 말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실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현황을 과대포장해 공사비를 최대한 뽑아먹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인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절반의 확신은 올해 벌어진 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채웠다. '순살 □□', '통뼈 △△', '흐르 ○○', 대형 건설사들이 수십년간 공을 들여 구축한 주택 브랜드 신뢰도도 줄줄 흘러내렸다.
줄줄 새는 곳이 어디 공사 현장뿐일까. 정치부 기자로 있을 때의 일이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판세와 분위기를 살피고자 몇몇 서울·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선거 사무실을 돌았다. 한 유력 정치인의 캠프를 선배 기자와 함께 방문해 기자임을 분명히 밝힌 후 후보가 사무실에 있는 지, 없다면 언제 들어오는 지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관계자가 뭔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 후보님 배우자 만나러 오셨구나. 지금 ☆☆빌딩 지하 사무실에 계세요'라고 말했다. 잘하면 후보 배우자를 인터뷰 할 수 있으니 땡잡았다고 생각하며 ☆☆빌딩으로 이동해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10명 남짓 여직원들이 헤드셋을 쓰고 책상에 앉아 연신 전화기로 보이는 기기를 두드리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른바 '전화방'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했다. 저 멀리 구석에서 후보 배우자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캠프에서 보내서 왔죠? 명단은 어디에 있어요?"하고 물었다. 선거사무원이 아니라 기자라고 밝히자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된다"며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고, 인터뷰 요청엔 당연히 응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르포 기사를 쓰기 위해 한 중진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 들어가 캠프 관계자들, 캠프를 찾은 지역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사무실을 나서려는 찰나에 보좌진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불러 세웠다. 캠프 한켠에 있는 칸막이를 가리키면서 '서류에 이름과 매체명을 적은 후 하나 가져가세요'라고 했다. 그의 손가락 끝이 향한 곳으로 가 보니 칸막이 뒤에 있는 책상 위에 봉투가 있었다. 말로만 듣던 '용돈'이었다. 수십만 원이 담긴 것으로 보였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캠프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따라 나오는 한 다른 매체 기자의 손에 봉투가 들려있었다. 오래 전부터 활동한 정치인이라 아직도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나 보다 싶었지만, 같은 날 한 신예 정치인 캠프를 찾은 후배 기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다. 검찰이 당시 20대 총선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선거사범 중 당선인은 33명, 19대(30명)보다 많았다.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채용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의혹으로 얼룩졌다.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돈봉투를 뿌리는 데에 사용된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당선된 정치인이 과연 본전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입법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람들은 폭우로 침수된 새 아파트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돈봉투 의혹과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수년 전과 마찬가지로 2023년 역시 물도, 돈도 줄줄 샌다.
*'방과후활동'은 기자의 과거 취재기를 통해 현재 이슈를 바라보는 기자칼럼이자 회고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