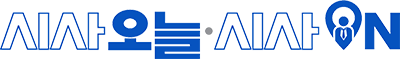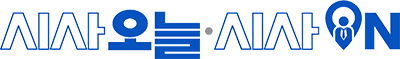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해 유통가(街)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와 직면했다. 연일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유통 공룡의 전통적 판매처인 오프라인 플랫폼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백화점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대형마트도 백화점만큼은 아니지만 실적 부진에 곤욕을 치렀다. 각 업체에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 포스트 또는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밑작업이었다. 이 밑작업을 통해 대형 유통사(社)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플랫폼 전환으로 가는 포석을 뒀고, 비대면 트렌드를 타고 온라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산업 흐름에 뒤늦게나마 적응하고자 여러 노력들을 했다.
일단 가장 손쉬운 일부터 진행했다. 자신들의 최대 강점인 자본력, 부동산, 유통망 등 유형자산과 온라인 사업의 시너지를 도모한 것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매장을 식품류 중심 공간으로 리뉴얼하고 이를 SSG닷컴(쓱닷컴)과 연계했고, 현대백화점그룹도 식품전문관을 선보이며 새벽배송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롯데그룹 역시 롯데온(ON)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오프라인 플랫폼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온·오프라인 연결 작업에 집중했다. GS그룹도 오프라인 거점인 GS리테일과 온라인 거점인 GS홈쇼핑 합병을 추진했다. 이에 힘입어 백화점, 마트 등은 올해 상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 합류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시장을 선점한 네이버, '빠른배송' 서비스 정착을 주도한 쿠팡 등에 SSG닷컴, 롯데온 등이 밀려 전체 온라인 쇼핑 성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유통업계의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 확실한 미래 먹거리, 대형 업체들은 두 번째로 손쉬운 일에 돌입했다. 자본력을 활용한 '합종연횡'(合從連衡) 카드를 뽑은 것이다. 주요 무대는 편의점과 이커머스다.
이번 합종연횡은 과거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이전 합종연횡의 키워드가 '뭉쳐야 산다'였다면 이번에는 '키워야 산다'에 가까워서다. 유통업체들이 합종연횡의 무대를 편의점, 이커머스로 설정한 배경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
편의점가는 매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퀵커머스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뜨겁다. GS리테일이 요기요 인수를 통해 한층 강화된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페이코와, 세븐일레븐은 위메프오와 각각 제휴 방침을 밝히며 배달 플랫폼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미 규모의 경제 초입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쿠팡의 급성장이 눈에 띄는 가운데 신세계와 네이버의 2500억 원 규모 지분 맞교환을 통한 반(反)쿠팡연대 구축,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11번가와 아마존의 협업 등 합종연횡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합종연횡은 계속된다. 1세대 이커머스 업체인 인터파크, 다나와 등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몸집 키우기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대표 업체로 평가되는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도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고, SSG닷컴도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를 주요 증권사에 발송했다. 이들은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물류 등에 투자하거나 M&A에 활용하는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사용할 전망이다. 편의점가도 최근 미니스톱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합종연횡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니스톱에서 매각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지켜봐야 할 사안이나 만약 매각이 실현될 경우 업계 내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승자독식 가능성이 높은 시장환경, 경쟁에서 조기 탈락하지 않으려고 규모를 키우는 데에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플레이어들, 'Join, or Die'(뭉치지 않으면 죽는다)가 아닌 'Increase, or Die'(키우지 않으면 죽는다)의 끝은 어디로 귀결될까. 유통가 합종연횡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