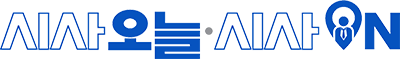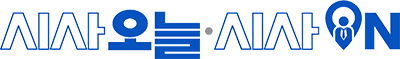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혁식 논설위원)
지난 주 새누리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돌발사건은 ‘녹취록 폭로’ 파문이었다. 친박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지난 1월 서청원 의원 지역구(경기 화성갑)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성회 전 의원을 상대로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며 회유·압박한 통화 내용이 반 년 만에 세상 빛을 본 것이다.
비박 진영에선 친박 핵심인사들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파 인사들의 공천을 위해 전횡을 저지른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들고 일어났다. 앞으로 당 중앙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주목된다.
당내 ‘다수파’ 시도는 대권 경쟁의 연장선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계파가 총선에서 자파 인사를 더 많이 당선시키려고 목을 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대권과 연결돼 있다. 당내 ‘다수파’가 되면 당장은 당 운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호조건이 만들어진다. 또 당대표 경선이 벌어지면 자파 후보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당권 장악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결전의 무대는 대권 레이스에서 펼쳐진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권자의 50%가 국회의원 영향력이 미치는 당원들이어서 당내 다수파는 자파에서 미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거둔 친박 진영의 ‘풍작’을 발판 삼아 4개월 뒤인 8월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경선도 꽃이라고 할 만하다. 총칼을 앞세운 무력이나 돈에 의존한 금력보다는 훨씬 이성적이고 신사적인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경선의 꽃은 지고 나면 뒤가 너무 지저분하다. 한국정치에서는 경선 후유증이 너무 심하게 지속된다.
‘승자독식’이 경선에도 적용
여·야가 맞붙는 선거에선 승자와 패자가 서로 갈 길을 간다. ‘승자독식’의 원칙에 따라 승자가 전리품을 다 가져가도 불만이 없다. 경선의 경우는 다르다. 경선은 상황이 끝나도 승자와 패자가 여전히 한 지붕 아래서 부대껴야 한다. 밥은 한 솥에서 펐을지 모르나 찬(餐)이 다르다. 이긴 쪽에는 ‘진수성찬’, 진 쪽에는 ‘소찬상’이 돌아간다. 여기도 승자독식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입각 정치인들과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들이 대부분 각 선거캠프 출신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3자를 기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편 사람은 요직에 쓰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 쪽은 절치부심하며 차기에서 역전을 노린다. 이긴 쪽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댄다. 이번 녹취록에서 드러난 친박 측의 공천개입 의혹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득권 유지 노력이다. 이런 돌발사건이 한 번씩 터지면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서로 간에는 오갈 수 있는 다리는 끊어진지 오래다. 한번 ‘상대 편’으로 낙인이 찍히면 되돌리기 어렵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친박’, ‘진박’, ‘범박’ 식으로 분화가 계속되는데, 상대 편이야 오죽할까.
정당 조직이 감정대립까지 가세한 내부 분열에 시달리면 그 피해는 당의 미래뿐 아니라 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까지 미친다. 필요하면 당 전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 공당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때 적잖은 지장이 초래된다. 집권여당으로서, 수권야당으로서 시의적절하게 당론을 모으고 입법방향을 정해야 할 때 혼선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다. 19대 국회 말 상시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때도 여당 내에서 그런 혼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패자는 승자를 돕지 않는다
더욱이 여·야가 맞붙는 선거 국면에서 분열의 악영향은 치명적이다. 경선의 패자는 승자를 돕지 않고, 승자도 패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대선전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2007년 대선 때는 야당에서 이명박 후보를 공격했던 X-파일 자료가 친박 진영에서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각종 ‘음모론’을 양산하고 계파의 응집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된다.
모든 경선이 이런 후유증을 낳는 것은 아니다. 현역의원만을 유권자로 삼는 원내대표 경선은 뒤탈이 거의 없다. 의원들은 어느 후보를 만나더라도 표심을 드러내지 않고 한 표를 줄 것처럼 ‘립-서비스’를 잘 한다. 그러나 투표장에선 비밀투표가 확실히 보장된다. 승자도 패자도 누가 누굴 찍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덕분에 선거가 끝난 뒤에는 앙금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평상으로 되돌아간다.
대선후보 경선에선 ‘피아 감별’ 노골적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에선 그렇지 못하다. 각 후보 진영에선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는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색해진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당대표 경선에선 그나마 ‘중립지대’가 남아 있다. 그런 조항이 없는 대선후보 경선에선 의원들을 상대로 피아(彼我) 감별이 노골적으로 이뤄진다. 일선 캠프에 현역의원들이 배치됨으로써 같은 당 의원들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불상사도 연출된다.
‘3金 시대’ 종언 이후 한국정치에서 다시 뿌리내린 당내 계파정치는 경선의 산물이다.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계파가 탄생하면 이후 총선후보 경선, 당대표 경선 등을 거쳐 차기 대선후보 경선에 이르기까지 계파의 동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돼 왔다.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일부 주자들이 ‘계파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계파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의원들이 여전히 다수이기 때문이다.
‘세도정치’와 같은 반열에 오를 ‘계파정치’
그러나 ‘열흘 붉은 꽃이 없다’(花無十日紅)고 했다. 내년이면 친이·친박 탄생 10주년을 맞는다. 12월 대선이 끝나면 여당 내 계파정치의 남은 한 기둥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계파정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경선을 통해 새 힘을 충전하거나 새 생명을 잉태한다면 그것은 한국정치의 불행이다. 21세기 ‘계파정치’가 소수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식하며 조선 망국의 길을 재촉했던 19세기 ‘세도정치’와 같은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前 영남일보 서울 정치부 기자
現 시사오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