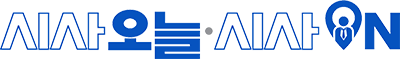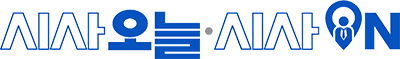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음료에 들어있는 유리조각을 발견 못해 함께 마시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34건, 2012년 32건, 2013년 31건으로 매년 30건이 넘는 '유리 이물 혼입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위해 사례 129건 중 91건(70.5%)가 유리조각을 함께 삼킨 사고였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에 불과했다.
상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74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건(45.9%)이 유리이물 섭취로 X-ray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베이거나 찔리는 등의 상처를 입은 뒤 자가 치료한 사례도 17건(23%)이나 됐다.
특히, 1세 유아가 유기농과일 음료에 혼입된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 113건(87.6%)이 용기 내부에서 균열·파손돼 유리가루가 혼입된 것이었다.
소비자원은 그 이유를 병과 병 사이 충격을 완화하는 간지나 바닥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파손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병 표면에 부착된 PET재질의 압착필름은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유리가루가 내부로 혼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자 안에 안에 간지와 바닥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종이로 교체하도록 식품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