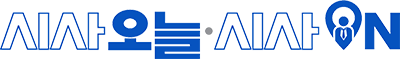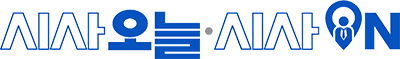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최기영 피알비즈 본부장)

올겨울은 유난히 눈이 귀하다. 1월 중순이면 엄동설한(嚴冬雪寒)일 텐데 요즘은 너무도 푹하다. 그런데 얼마 전 강원도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리라고 마음을 먹고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지난 주말 눈길을 걷기 위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계방산으로 향했다.
계방산(1577m)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 5위 봉이다. 산이 크고 깊은 데다, 적설량이 많아 겨울철 등산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높은 산이지만 남한에서 자동차로 넘을 수 있는 고개 중 함백산 만항재(1330m) 다음으로 높은 운두령(1089m)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눈길을 그리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나도 일찌감치 산행을 신청해 놓고 산악회 버스를 타고 운두령으로 향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거기서 거기인 모양이다. 강원도에 내린 눈 소식을 들은 산꾼들이 어찌나 많이 모였는지 운두령 고개는 그야말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촘촘하게 사람들이 만든 긴 줄을 따라 나도 산행을 시작했다. 산길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길을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는 '뽀드득뽀드득' 눈 밟히는 소리가 났다. 새벽녘에 피어올랐던 상고대가 아직도 남아 있어 그야말로 설국(雪國)에 들어온 듯 신이 났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비교적 순한 오르막이 이어지며 왼쪽으로 보이는 설악산, 가칠봉, 오대산 자락의 장쾌한 산세가 일품이다. 계방산(桂坊山)은 오대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한자 풀이대로라면 '계수나무 향기가 나는 산'이다. 희귀한 산 약초와 야생화가 많아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계방산은 칡이 없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권대감이라는 사람이 이 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칡넝쿨에 걸려 넘어지며 다리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자 부적을 써서 이 산의 모든 칡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권대감은 안전한 산행을 바라는 심마니들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기도 하다.
산행이 이어지며 몸에서는 열기가 올라왔고,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오르자 아름답게 피어 있던 상고대도 녹아 흘러내렸다. 잠시 허기를 달랜 후 약 1시간 정도 이어지는 가파른 산길을 서서히 걷다 보니 드디어 계방산 정상에 도착했다. 그러자 눈 덮힌 계방산이 파란 하늘 아래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내 눈앞에 펼쳐졌다. 계방산 정상이야말로 푸른 바닷속에서 만나는 하얀 산호초처럼 산줄기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설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진수다.


운두령에서 정상으로 오는 길에는 샛길 하나 없지만, 정상에서 계방산을 내려오는 길은 세 개의 갈림길로 나뉜다. 다시 운두령으로 돌아가는 길과 계방산삼거리 방면, 그리고 자동차 야영장 쪽으로 하산길을 잡을 수 있다. 나는 주목군락을 보기 위해 자동차 야영장 쪽으로 향했다.
정상에서 조금 걸어 내려오면 길이 몹시도 가파른데 그곳에 바로 주목 군락지가 있다. 그 가파른 산길에 크고 높은 주목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生千年 死千年)을 산다는 주목(朱木)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친 뒤 수북하게 눈을 덮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늠름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가파른 주목 군락지를 조심조심 내려오면 노동계곡 길을 만난다. 경쾌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이승복 생가를 지나고 거기에서 1시간여를 계방산 삼거리 방향으로 걸으면서 산행을 마무리했다.
<전략>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기어 / 생목 툭툭 끊어져 나뒹구는 겨울나무들
나무들이 삼키는 비명 / 그들 모두 수다하게 지껄이진 않지만
바람과 눈과 기온이 절묘하게 서로 만나 / 피워낸 설화
겨울 해 아래 날카롭게 빛나는 투명한 꽃
그 무게 이마에 얹고 또 한 계절 / 살아내는 것이다
-김영숙 님의 詩 <슬픔이 어디로 오지?> 中
계방산에 피어있던 아름다운 눈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앙상하게 남은 나뭇가지와 차가운 바람의 사랑이다. 1년 열두 달 숲속의 나뭇가지는 자신을 그렇게도 다정하게 어루만졌던 부드러운 바람을 아무도 없는 한겨울 새벽녘에 드디어 만나 눈꽃을 피운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며 그 모습을 엿보자 눈꽃은 눈물처럼 녹아버렸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불을 지르듯 확 피어났다가 눈꽃은 기약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결국, 그리도 짧고 황홀했던 조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이내 아쉬움과 그리움만이 남는다. 이날도 운두령에서 산행을 시작하며 봤던 눈꽃은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사라졌다. 어차피 가둘 수도 없고 언젠가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젊은 날의 불같았던 사랑처럼 말이다.

산에서 내려오니 땀이 식어버린 탓에 온몸에는 한기가 돌았다. 우리가 타고 왔던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계방산 삼거리에 도착해보니 여기저기에서 신나는 산행 뒤풀이가 한창이었다. 나도 일행을 만나 자리를 잡고 따뜻한 국물에 술 한잔이 들어가자 금세 몸은 노곤해졌다.
차가운 겨울 새벽녘마다 나뭇가지에서 피어나는 계방산의 눈꽃이 그리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네의 삶도 이미 온갖 인연들과의 풍상을 견디어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최기영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前 우림건설·경동나비엔 홍보팀장
現 피알비즈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