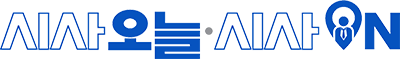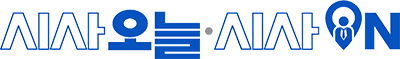(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기범 영화 기자)

LA 고속도로에 가득 메워진 각양각색의 자동차 사이를 넘나드는 젊은 남녀들의 일사불란한 군무와 노래는 어쩌면 이제 막 들어선 관객들에게 그저 그런 뮤지컬 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치만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최소한 1980년의 아이린 카라가 그려냈던 <페임> 이라도 연상시켰다면 이 컬러풀한 플라밍고들의 현란함은 신선한 시작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충분히 다다른 것일 터이다.
그러나 그 장대한 오프닝이 끝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스쳐갈 무렵이면 한 편의 그저 그런 뮤지컬에 대한 상투적 지레짐작에는‘설마’나‘혹시’라는 부사어가 따라 붙는다.
롱테이크로 잡아낸 길고 긴 그 고속도로가 숱한 시네필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오즈의 마법사> 에 나오는 그 노란 벽돌 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은 얇은 피부 밑을 흐르는 타고난 본능의 촉이 이미 미세하게 곤두세워진 이후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뇌하는 남자 재즈 피아니스트와 늘 오디션을 준비하는 여배우 지망생의 사랑 같은 애틋함은 멜로라는 장르를 공유하는 동서고금의 모든 영화가 익히 보여주었던 식상하고 통속적인 공통분모일 뿐이다.
그러나 알리 맥그로우와 라이언 오닐의 <러브스토리> 가 우리의 여린 가슴에 로맨스의 방점을 찍은 이래, 쇠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 고전적 소재의 진부함이 <라라랜드>(La La Land) 처럼 21세기 고감도 채색을 뒤집어쓰고 1940년대 할리우드 황금기의 스크루볼 코미디로 부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시린 올해의 끄트머리를 장식할 <라라랜드> 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은 거대도시의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세파에 찌들고 지친 우리를 현실과 잠시 유리시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를 이어주는 환상의 공간이다.
아름드리 팜 트리가 구석구석 배어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외지인들에게는 늘 한결같듯, 이 천사의 도시가 곳곳에 품고 있는 성지에는 할리우드의 눈부심을 서사했던 위대한 영혼들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변함없이 쏟아진다.
라이트하우스 카페의 고색창연한 재즈는 달팽이관을 타고 흘러 들어와 자고 있던 우리의 망막을 깨우고, 그렇게 번쩍 뜨인 두 눈은 다시 리알토 극장의 제임스 딘을 갈구한다.
1950년대에 이유 없이 반항하던 청춘의 아이콘에 대한 그리움은 끝내 그리피스 천문대로의 순례를 인도하고, 아름다운 밤하늘 속에서 싹을 틔우는 두 남여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첫사랑을 얽어낸다.
2015년의 <위플래쉬> 로 음악에 대한 광기어린 열정과 성취를 단순히 영화 속 주인공만의 허상이 아닌, 관객의 가공할 전율로 만들어버린 다미엔 차젤레는 2016년의 <라라랜드> 를 통해 음악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자신의 본래 꿈을 기어이 이루어 내고야 만다.
우리의 오감을 들쑤시는 <라라랜드> 의 음악들은 단순히 영상과 관객을 이어 주는 가교가 아니라, 아예 끈을 놓고 살았던 그 옛날의 동화를 반추시키는 묘한 마법이다.
시네마스코프에서 몽환적으로 울려 퍼지는‘별들의 도시’(City of Stars) 에는 어릴 적 일요일 밤의‘명화극장’을 웅장하게 열었던‘타라의 테마’(Tara′s Theme) 의 또 다른 숨결이 흐른다.
경쾌한 리듬과 위트의 트랙에서 미끄러지는 음악과 대사들은 결국 흑백의 <필라델피아 스토리> 에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을 다시 입힌다.
아이폰과 유튜브가 캐리 그랜트와 제임스 스튜어트, 그리고 캐서린 햅번을 세련되게 소환하는 또 다른 혁신의 순간이다.
생기는 것 없이 마냥 들뜨기만 했던 연말연시의 TV 에 비치던 <사랑은 비를 타고> 의 부푼 가슴과 <로마의 휴일> 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대신했던 젤라토의 감미로움은 당연하다.
원형을 탈피하라는 시대의 조류에 밀려 조금씩 변하는 재즈처럼, 현실에 지쳐 점점 소멸되고 마모되는 젊은 시절로 잠시라도 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라라랜드> 는 분명‘이런 것이 바로 영화’라는 명쾌한 답변을 선사한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 의 도로시가 무지개 저 편에 있을 어딘가를 찾다 결국 자신의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두어 시간의 마법이 풀리면 어느새 우리 모두는 끝내 영화의 환상을 뒤로 하고 현실로 귀환해야 함을 깨닫는다.
타인의 열정에 대한 몰입은 이루지 못한 자신의 열망에 대한 대리 위안임을 깨우치는 것처럼, 어쩌면 꿈과 환상에 도사리고 있을 실패와 좌절을 피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모든 남여의 러브스토리가 늘 해피엔딩일 수는 없듯, 우리의 삶 또한 항상 영화일 수만은 없다.
다만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때에는 되는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기다리다 마음 가는 곳으로 가라는 어느 여류 소설가의 말처럼, 성공과 환희에 대한 성급한 집착 보다는 주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맡겨 놓는 것이 현명한 답안일 수 있다.
<라라랜드> 는 그렇게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반복되는 숱한 만남과 이별, 성공과 좌절을 자신의 가슴에 어떻게 아름답게 남기느냐에 따라 <카사블랑카> 의 멋들어진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준다.
잊고 있었던 과거의 꿈과 사랑, 희망과 열정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고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환상의 수작은 많은 이들이 그토록 기다려 왔던 <쉘부르의 우산> 의 여운과 <시네마 천국> 의 감동을 모처럼만에 선사하며 상영되는 내내 극장 안에 벅찬 적막의 공기가 휘돌게 만든다.
한 세월의 끝자락에 으레 찾아오는 애달픈 후회와 싱그러운 희망의 교차보다는, 속절없는 분노와 절망이 몰려올지도 모르는 지금의 우리에게 12월 7일의 전 세계 최초 개봉은 그나마 천사들의 도시가 주는 축복의 선물이다.
꿈의 공장을 찾는 이들이여,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를!
12세 이상 관람가.
뱀의 발 : <라라랜드> 의 언론시사회에서는 엔드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무척이나 드문 일이지만, 늘 내색 없이 냉철하게 영화를 평가하는 이들의 얼굴선 밑에도 뜨거운 눈물은 흐르는 법이다.
★★★★★

·영화 저널리스트
·한양대학교 연구원 및 연구교수 역임
·한양대학교, 서원대학교 등 강사 역임